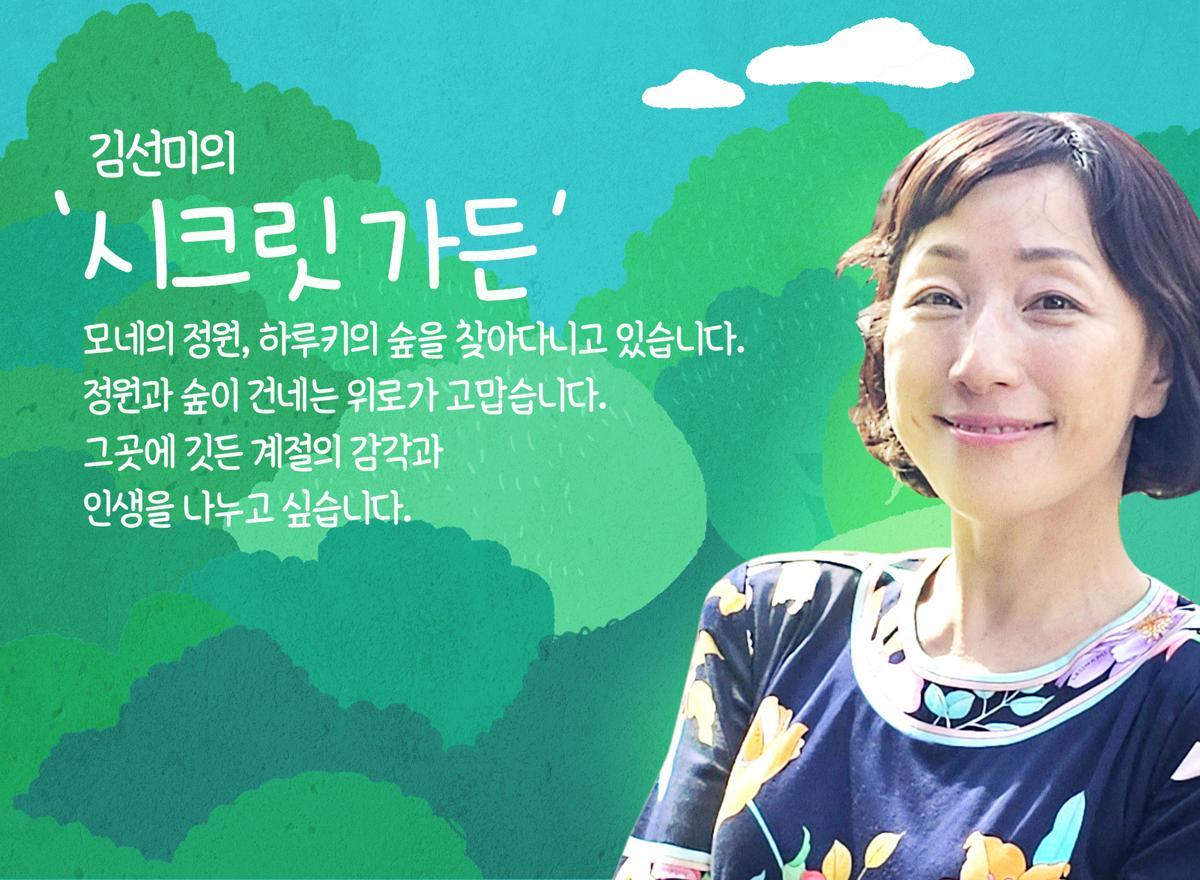2022년 경북 울진군 화재로 까맣게 탄 민둥산에 당시 양지꽃이 피어났던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었지만 봄은 잿빛입니다. 화마(火魔)가 집어삼킨 우리 숲을 생각하면 버드나무 가지처럼 마음에 눈물이 흐릅니다. 도깨비불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속수무책인지요.
겨울을 견딘 나무들이 꽃눈과 새잎을 터뜨리는 생명의 계절에 불길이 숲을 할퀴며 옮겨붙고 있습니다. 메마른 건 날씨와 토양만이 아닐 겁니다. 이 땅의 산과 숲, 그 속에 숨 쉬는 문화와 생명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도 그처럼 말라 있던 건 아닐까요. 무엇을 지키지 못했는지, 무엇을 외면했는지,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이 땅의 숲에 묵념을 올립니다.
26일 경북 의성군 일대 산등성이가 전날 발생한 산불로 탔다. 의성=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한국의 민주주의가 압축 성장하며 진통을 겪듯, 한국의 숲도 급속한 치산녹화를 지나 기후변화를 맞았습니다. 단 몇 도의 기온 상승이 재앙을 키운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위험지수는 기온이 1.5도 상승할 때 8.6%, 2.0도 상승할 때 13.5%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산림이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산불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회재난입니다. 그에 맞는 재난관리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예컨대 목재 모듈러 하우스를 평소에는 휴양림 숙소로 사용하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이재민을 위한 쉼터로 옮겨 전환할 수 있습니다. 숲은 상처를 보듬고 회복을 이끄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전국 숲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입니다.
이번 산불로 잿더미가 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 연수전이 불타기 전인 2021년 모습. |
이번 산불을 계기로 ‘소나무 탓’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소나무 송진이 불을 옮기고 활엽수가 불길 확산을 막는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심 온도가 1500도가 넘는 산불에는 침엽수도 활엽수도 다 타버립니다. 기후변화로 건조해진 토양, 무분별한 입산과 관리 미흡 등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문, 사회, 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건설적 논의를 통해 건강한 숲을 다시 일궈야 합니다.
산림과학원은 바람의 방향 등 기후 인자를 통한 산불 확산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단위로 산림청에 예측 결과를 보내 다른 부처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통해 진화 작전을 펼치고, 피해가 예상되는 민가와 국가유산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90%인 예측도를 높이는 게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불을 내는 건 대체로 사람입니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행동을 분석해 위험 지역을 예측한다고 하니 기대와 경계를 함께 품어봅니다.
전국에 산불이 번졌지만 전남 담양군 소쇄원에는 봄꽃이 활짝 폈다. |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빨리빨리’가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시간 감각은 조급하지만, 나무는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무를 가꾼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나무가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산불 이후 숲을 어떤 방식으로 복원할 것인가. 그 해답은 나무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빠르지 않고 나지막하지만 놓쳐서는 안 될 숲의 언어입니다.
천년고찰이 불타고 불길이 삶터를 지나도 숲은 봄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고요한 잿더미 속에서 새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얼마나 큰 슬픔을 삭이고 있을까요. 피해 이웃을 위로하며 그래도 단단하게 살아갈 이유, 숲이 그 답을 조용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