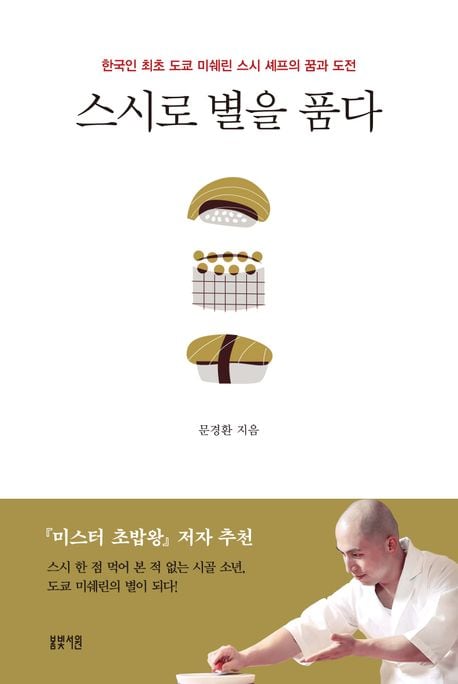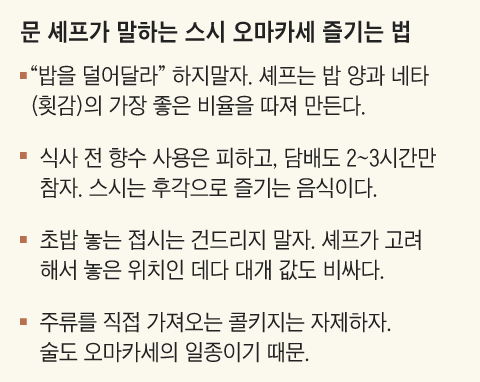문경환 셰프는 “업장에서 손님과 나누는 대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소통이 아닌 고급 어휘까지 구사할 수 있도록 일본어 연습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스시야 쇼타 인스타그램 |
한국인 최초로 일본 스시 부문에서 미쉐린 1스타를 받은 문경환(38) 셰프는 정작 성인이 될 때까지 스시를 먹어본 적 없다. 충남 논산 딸기 농장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중3 때 일본 만화 ‘미스터 초밥왕’을 보고 처음 초밥이란 세계를 알았다. “당장 뭘 할지 목표도 없는 상황에서 같은 나이의 ‘쇼타’(’미스터 초밥왕' 주인공)가 꿈을 위해 밤새워 연습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나도 여기에 에너지를 한번 쏟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18년 뒤 실제 이 소년은 일본 도쿄 아자부주반에 자신의 가게 ‘스시야 쇼타’를 열고, 첫 손님으로 ‘미스터 초밥왕’ 작가인 ‘데라사와 다이스케’를 맞는다.
최근 자신의 이런 꿈과 도전을 담은 책 ‘스시로 별을 품다’(봄빛서원)’를 낸 문 셰프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났다.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민 상태였다. 그는 “초밥을 만드는 건 요리라기보다 수행(修行)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매일 아침 머리를 밀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했다.
19세에 처음 맛본 초밥
그는 고3 겨울방학 때 시내버스로 한 시간 반 거리의 논산 시내 횟집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처음 초밥을 맛봤다. “이때 처음 생선 손질법 등을 익혔다. 가슴이 쿵쾅거릴 정도로 좋아서 ‘이 길이 맞구나’ 싶었다”고 했다.
이후 우송대 외식 조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의 미스터 초밥왕’이라 불리는 안효주 셰프의 ‘스시효’에서 일했다. 문 셰프는 “생선에 대한 기술도 많이 배웠지만, 스시효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꼽으라면 ‘청결’”이라고 했다. “스시는 맨손으로 날 생선을 만지는 일이다. 주변 정리가 안 돼서 위생 상태가 더럽고 생선을 대충 자르는 요리사는 일류가 될 수 없다.”
스시효에서 3년 만에 초밥 만드는 자리에 설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이를 포기하고 일본으로 갔다. “너무 좋은 제안이라 오히려 도쿄에서 초밥을 만들겠단 꿈을 포기하고 안주할까 무서웠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에선 언어가 발목을 잡았다. 모은 돈과 시간만 버리는 날이 계속됐다. ‘마지막으로 도쿄에서 제일 맛있는 스시나 먹고 가자’는 생각에 남은 돈 30만원을 털어 간 곳이 ‘스시 가네사카’다. 일본 외에도 해외에 다수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도쿄 고급 스시 식당. 스시를 먹으며 담당 셰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뜻밖에도 가네사카 사장과의 자리를 주선해줬다.
문경환 셰프. /스시야 쇼타 인스타그램 |
문 셰프는 “나중에 왜 나를 뽑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고 했다. “처음엔 스시 만드는 일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고된 일이라 근면 성실한 면을 보고 뽑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 눈빛에서 ‘스타성’이 보였다고 한다. 시골 촌뜨기에게 무슨 스타성일까 했지만, 허튼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 때면 이 말을 생각하며 버텼다.”
그는 다시 이곳에서 청소부터 시작했다. 3년 차부터는 매일 사비로 바닷장어를 사서 영업이 끝난 밤 11시부터 홀로 2~3시간씩 실습을 했다.
생선을 배울 땐 처음 머리 손질부터 시작한다. 그다음 껍질 벗기는 기술을 익히고, 전어나 전갱이 같은 작은 생선을 손질하는 기술을 익힌다.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최고 난도가 바닷장어다. 어느 날 그가 연습하는 모습을 우연히 본 가네사카 사장이 “초밥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한 끝에, 그는 초밥을 쥐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
인기 만화 ‘미스터 초밥왕’ 저자인 데라사와 다이스케(왼쪽) 작가와 지난해 찍은 사진. /문경환 셰프 제공 |
‘미스터 초밥왕’ 작가의 단골집
문 셰프는 가네사카에서 초밥왕 주인공 이름을 딴 ‘쇼타’라는 이름을 썼다. 어느 날 “왜 쇼타냐”라는 손님 질문에 사연을 얘기했더니, 다음번에 그 손님이 데라사와 작가를 데리고 왔다. 그 인연이 이어져 2019년 문 셰프가 자신의 가게 ‘스시야 쇼타’를 열 때 첫 손님이 데라사와 작가가 됐다.
‘스시야 쇼타’는 개업 1년째 미쉐린 1스타를 얻었고, 최근까지 매해 이 별을 유지하고 있다. 스시 부문에서 별을 받은 외국인은 그가 처음이다.
“2019년 점심이었는데, 혼자 오신 분이 식사 마치고 맛있었다는 인사 후 계산하고 나가셨다. 앞치마 풀고 정리하려는데 그분이 다시 오셔서 ‘미쉐린에 등재해도 되겠느냐’고 묻더라. 요즘 일부 가게에선 ‘미쉐린에 평가받고 싶지 않다’는 곳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다고 들었다. 처음 든 생각은 ‘아, 미리 귀띔 좀 해주시지’ 하는 것. 등재 첫해는 순수하게 너무 기뻤는데, 매해 별이 이어지면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거워졌다.”
문경환 셰프의 초밥. /스시야 쇼타 인스타그램 |
그에게 스시는 밥의 온도, 굳기, 밥과 생선을 같이 먹었을 때 입안에서 사라지는 정도 등 모든 것을 연구하고 고려해 균형을 맞춘 ‘최상의 작품’이다.
문 셰프는 “어떤 스시든 최고의 밸런스는 씹어서 목에 넘겼을 때 밥알이 입안에 2~3알 정도 남는 상태다. 밥과 네타(횟감)의 비율이 잘 맞으면 씹는 순간 식감이 좋고 일체감을 맛볼 수 있다”고 했다. 밥 양을 적게 하고 식감이 질긴 오징어를 위에 올려 놓으면 밥은 다 먹어서 입안에 없는데 오징어만 계속 씹게 된다. 반대로 식감이 부드럽고 두께가 얇은 네타에 밥 양을 많이 잡으면 나중엔 밥만 씹게 된다.
“오마카세 이유 없이 비싸선 안 돼”
문 셰프는 처음 온 손님이면 무조건 알레르기 유무와 취향 등을 노트에 기록한다. 그 손님이 다시 오는 날이면 수산시장에서 그가 좋아했던 재료를 기억해 구입한다. 그가 여전히 매일 새벽 5시 직접 수산시장에 가는 이유다.
“오마카세라고 해서 이유 없이 비싸선 안 된다. 손님이 이 돈을 내고 먹을 만한 이유가 있는 스시를 만들어야 한다. 새벽 시장을 갈 때부터 오늘 오는 손님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손님이 좋아하는 걸 찾으러 가는 게 오마카세 접객의 시작이다. 전복을 좋아한다면 가격이 어떻든 그걸 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격이 비싸진다면 손님은 또 그걸 신뢰하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오마카세”라고 했다. 손님이 대화를 많이 하는 걸 선호하는지, 혼자 음미하면서 먹는 걸 즐기는지도 파악해 메모해 놓는다.
문 셰프는 “어느 수준 이상으로 가면 ‘맛있는 식당’은 많다. 그러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식당’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했다. “손님이 왔을 때 어떤 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기쁠지, 술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차의 온도는 어떤지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저 가게를 가면 100%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100% 행복해진다’ 하는 게 진정한 ‘오마카세’”라고 했다.
그는 스시를 만들며 가장 뿌듯한 순간으로 부모님께 처음 초밥을 만들어 드렸을 때를 꼽았다. “어머니가 첫 점을 드시더니 우시더라. 나도 초밥 쥐기가 힘들었다. 외국인으로 일본에서 스시 셰프가 되기까지 어려운 점도 많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다.”
그래픽=김의균 |
☞문경환(38)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19세 때까지 초밥을 먹어본 적 없다. 우송대 외식조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강남 ‘스시효’에서 근무하다 ’30대엔 도쿄에서 초밥을 쥐겠다’는 일념으로 일본으로 떠났다. ‘스시 가네사카’에서 일하다, 2019년 자신의 가게 ‘스시야 쇼타’를 열었다. 개업 1년째인 2020년 미쉐린 1스타에 올랐고, 5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다.
[남정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